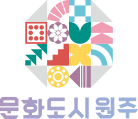[원주의 맛]
‘맛집’의 첫 번째 조건은 물론 맛이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음식을 사 먹는 행위는 단순히 입으로 먹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외식 트렌드는 휙휙 변하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어제의 맛집이 오늘도 여전히 맛집이리라는 보장도 없게 되었죠. 오랜 시간 꿋꿋하게 맛집으로 남으려면 몇몇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맛은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거나 위생 상태, 서비스, 분위기가 별로라면 망설이게 되고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주차가 불편하다면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맛집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모든 관문을 가볍게 뛰어넘거나 무시할 만한 완벽한 ‘맛’을 자랑하는 보편타당한 맛집 찾기는 쉽지 않겠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집 조건이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맛’을 느끼는 미각이나 음식 취향도 제각각일 테니 단순히 어디가 맛집인가를 단답형으로 나누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 모토처럼 맛이란 곧 ‘경험’을 뜻하기도 하죠. 나는 비록 마라탕이나 추어탕을 안 먹고 칼국수를 즐기지 않으며 튀김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맛을 언젠가는 새롭게 경험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원주 맛집이라고 했으니 ‘원주의 맛’은 무엇일까 떠올려봅니다. ‘원주’ 하면 떠오르는 ‘맛’, 맛의 문화, 문화가 되어 버린 맛이 있을까. 예컨대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산다면 그리워질 원주의 맛, 그 맛을 위해 찾고 싶은 곳이 있을까. 이사를 가도 생각날 원주의 음식, 일상의 동선과 주어진 조건 내에서 고르는 상대적인 기준의 맛집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는 맛집, 어쩌다 원주에 오게 되면 꼭 들러야 하는 그런 곳, 먹어야 하는 음식 말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그런 원주 맛집 하나쯤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음식이 전국 어디서나 원주라는 지역 이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일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저는 노다지의 닭발이 그렇습니다. 놀러 온 서울 친구들을 데려가서 실패한 적이 없고, 원주에 오면 함께 그곳에 들르는 게 당연한 코스가 된 이들도 몇몇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누리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대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주의 맛인 거죠. 노다지 주변이 ‘닭발 거리’ 같은 게 되면 어떨까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여행하다 보면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몰려 있는 무슨 거리, 무슨 골목 같은 것을 종종 보니까요. 그런 거리는 보통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일종의 순례 코스 같은 게 되죠.
아무튼 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몇 안 되는 연탄불 자리를 맡기 위해 6시 땡 오픈 시간에 맞춰 일산동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매버릭 | 로컬 칼럼니스트, 재야의 아키비스트.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소속 없이 직책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깍두기. 사는 만큼 말하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 쓸데없이 근질거리는 입을 오늘도 꿰매고 싶은 사람.
‘맛집’의 첫 번째 조건은 물론 맛이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음식을 사 먹는 행위는 단순히 입으로 먹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외식 트렌드는 휙휙 변하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어제의 맛집이 오늘도 여전히 맛집이리라는 보장도 없게 되었죠. 오랜 시간 꿋꿋하게 맛집으로 남으려면 몇몇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맛은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거나 위생 상태, 서비스, 분위기가 별로라면 망설이게 되고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주차가 불편하다면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아니 그림의 맛집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모든 관문을 가볍게 뛰어넘거나 무시할 만한 완벽한 ‘맛’을 자랑하는 보편타당한 맛집 찾기는 쉽지 않겠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집 조건이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맛’을 느끼는 미각이나 음식 취향도 제각각일 테니 단순히 어디가 맛집인가를 단답형으로 나누는 건 어쩌면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는 어느 예능 프로그램 모토처럼 맛이란 곧 ‘경험’을 뜻하기도 하죠. 나는 비록 마라탕이나 추어탕을 안 먹고 칼국수를 즐기지 않으며 튀김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맛을 언젠가는 새롭게 경험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원주 맛집이라고 했으니 ‘원주의 맛’은 무엇일까 떠올려봅니다. ‘원주’ 하면 떠오르는 ‘맛’, 맛의 문화, 문화가 되어 버린 맛이 있을까. 예컨대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산다면 그리워질 원주의 맛, 그 맛을 위해 찾고 싶은 곳이 있을까. 이사를 가도 생각날 원주의 음식, 일상의 동선과 주어진 조건 내에서 고르는 상대적인 기준의 맛집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는 맛집, 어쩌다 원주에 오게 되면 꼭 들러야 하는 그런 곳, 먹어야 하는 음식 말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그런 원주 맛집 하나쯤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음식이 전국 어디서나 원주라는 지역 이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일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겠지만, 저는 노다지의 닭발이 그렇습니다. 놀러 온 서울 친구들을 데려가서 실패한 적이 없고, 원주에 오면 함께 그곳에 들르는 게 당연한 코스가 된 이들도 몇몇 있습니다. 다양한 ‘맛’을 누리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대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생각하는 원주의 맛인 거죠. 노다지 주변이 ‘닭발 거리’ 같은 게 되면 어떨까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여행하다 보면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몰려 있는 무슨 거리, 무슨 골목 같은 것을 종종 보니까요. 그런 거리는 보통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일종의 순례 코스 같은 게 되죠.
아무튼 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몇 안 되는 연탄불 자리를 맡기 위해 6시 땡 오픈 시간에 맞춰 일산동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매버릭 | 로컬 칼럼니스트, 재야의 아키비스트.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소속 없이 직책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깍두기. 사는 만큼 말하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 쓸데없이 근질거리는 입을 오늘도 꿰매고 싶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