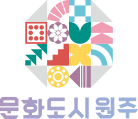[그 숫자를 처음 정했던 순간]
요즘엔 보통 전화 걸 때 저장 목록에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라면 단축 번호를 누르거나 최신 통화 목록을 열곤 하겠죠. 딱히 남이 내 번호를 기억하게 하거나 전화번호로 깊은 인상을 줘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삿짐센터나 배달 업종, 고깃집이라면 2424, 8282, 9292 같은 번호들이 간절했겠지만요.
그냥 평범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든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쇼핑몰 비밀번호와는 달리 한번 정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오래 써야 하는 번호였을 테니, 아마 처음에 신중하게 고민했을 텐데••• 저런. 저는 별 고민 없이 ‘뭘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까먹지 않고 어디 가서 바로 적을 수 있는 번호면 되지.’ 하며 정했군요.
아마 생년월일이나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따라 많이들 정했을 거고, 반대로 개인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숫자를 일부러 고른 사람도 있겠죠. 또는 개인적인 기념일이나 당시 자신에게 중요한 숫자를 나름 정했을 겁니다. 의미보다는 무조건 기억하기 쉬운, 혹은 누르기 편한 숫자를 고르거나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소위 ‘골드번호’라 불리는 숫자를 열심히 공략하기도 했겠고요. 인기가 높은 골드번호들은 꽤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화번호 뒷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숫자 자체보다 어쩌면 그 숫자를 처음 정했던 순간, 그러니까 ‘내 전화’라는 걸 처음 손에 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첫 휴대전화에 관한 기억 말이죠. 아마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기억의 결은 서로 다르겠지만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엄마 따라 휴대폰 가게에 가서 번호를 고르던 두근거림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삐삐를 탈출했던 그때를. 더는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집 전화기가 아닌 내 전화기로, 거실이 아닌 내 방에서 친구와 처음 속닥거리던 자유와 해방(?)의 순간을 말이죠. 그 은밀한 순간을 함께했던 나의 첫 전화기는 지금은 유물이 되어 집 어딘가에서 고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시해진 내 인생의 비밀들과 함께.
매버릭 | 로컬 칼럼니스트, 재야의 아키비스트.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소속 없이 직책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깍두기. 사는 만큼 말하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 쓸데없이 근질거리는 입을 오늘도 꿰매고 싶은 사람.
요즘엔 보통 전화 걸 때 저장 목록에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라면 단축 번호를 누르거나 최신 통화 목록을 열곤 하겠죠. 딱히 남이 내 번호를 기억하게 하거나 전화번호로 깊은 인상을 줘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삿짐센터나 배달 업종, 고깃집이라면 2424, 8282, 9292 같은 번호들이 간절했겠지만요.
그냥 평범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든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쇼핑몰 비밀번호와는 달리 한번 정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오래 써야 하는 번호였을 테니, 아마 처음에 신중하게 고민했을 텐데••• 저런. 저는 별 고민 없이 ‘뭘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까먹지 않고 어디 가서 바로 적을 수 있는 번호면 되지.’ 하며 정했군요.
아마 생년월일이나 집 전화번호 뒷자리를 따라 많이들 정했을 거고, 반대로 개인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숫자를 일부러 고른 사람도 있겠죠. 또는 개인적인 기념일이나 당시 자신에게 중요한 숫자를 나름 정했을 겁니다. 의미보다는 무조건 기억하기 쉬운, 혹은 누르기 편한 숫자를 고르거나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소위 ‘골드번호’라 불리는 숫자를 열심히 공략하기도 했겠고요. 인기가 높은 골드번호들은 꽤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화번호 뒷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숫자 자체보다 어쩌면 그 숫자를 처음 정했던 순간, 그러니까 ‘내 전화’라는 걸 처음 손에 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첫 휴대전화에 관한 기억 말이죠. 아마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기억의 결은 서로 다르겠지만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엄마 따라 휴대폰 가게에 가서 번호를 고르던 두근거림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보고 저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삐삐를 탈출했던 그때를. 더는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집 전화기가 아닌 내 전화기로, 거실이 아닌 내 방에서 친구와 처음 속닥거리던 자유와 해방(?)의 순간을 말이죠. 그 은밀한 순간을 함께했던 나의 첫 전화기는 지금은 유물이 되어 집 어딘가에서 고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시해진 내 인생의 비밀들과 함께.
매버릭 | 로컬 칼럼니스트, 재야의 아키비스트.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소속 없이 직책 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깍두기. 사는 만큼 말하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 쓸데없이 근질거리는 입을 오늘도 꿰매고 싶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