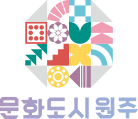원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곳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를 타 지역에서 다녔지만 집은 여전히 원주였다. 어릴 적 살던 단계아파트에서 무실동으로 이사 가 주공아파트 몇 채를 제외하면 허허벌판이던 곳이 지금의 무실동으로 바뀌기까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새로 생겨나는 변화와 함께 추억 또한 다채로워졌다.
무실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사소한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던 유희왕 카드와 불량식품 등은 비슷한 시기를 보낸 이들에겐 폭넓은 공감대일 것이다. 지금은 막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무실초등학교를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얕은 산은 예전에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코너에 있었던 그네를 타다가 친구들과 함께 탐험한다고 그 얕은 산을 곳곳으로 돌아다녔던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자전거에 얽힌 기억도 꽤 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것도 무실동에 살던 때였고, 그렇게 배운 자전거로 곳곳을 다니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무실초등학교에서 가까이 접해 있는 송삼마을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꽤나 가파르게 경사진 초입을 빠르게 타고 내려가는 것도, 마을 중간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았다.
중학교는 예상치 못한 3순위 학교로 배정받았고, 비슷한 시기 집도 학교와 정반대에 위치한 흥업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매일의 등하교가 1시간짜리 여행이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매일 같은 듯 다른 창밖 풍경을 보고, 창문에 머리 기대고 자다가 결국 연세대 종점까지 가는 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었다. 30번과 31번, 34번 버스를 번갈아 타며 보던 길과 풍경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원주에서 버스를 탈 일이 있으면 환승을 해서라도 여전히 해당 노선의 버스들을 찾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이켜보곤 한다.
원주와 관련된 기억이라면 농구를 빼 놓을 수 없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농구보단 맛있는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따라 경기장을 많이 찾았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보는 것에도, 하는 것에도 재미를 붙여 친구와 함께도, 혼자서도 꽤 자주 경기를 보러 다녔다. 어린 시절 가족과 자주 갔던 치악산도 원주만의 놀거리였지만 농구팀의 연고지라는 점이 어린 시절 원주에 애정을 갖게 했던 하나의 포인트였다.
------------------------------------------------------------------------
원주에서 태어나 삼성아파트부터 주택, 그리고 무실동으로 이사를 오기까지 내 고향은 언제나 강원도 원주로 기억되었다. 비록 지금은 학교를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뵈러 원주로 가는 기차를 탈 때면 그때 그 시절 추억에 잠기곤 한다. 백합유치원부터 평원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번 급식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칭찬빨대’를 반납하곤 했던 나는 평원초 앞 떡볶이집에서는 천원짜리 컵떡볶이를 금방 해치워 버리는 아이였다. 평원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각각 다른 문구점들이 있었는데, 친구들 별로 자신만의 선호하는 문구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무서운 아저씨가 계시던 문구사에서 뽑기를 즐겨하곤 했는데, 엊그제 근처를 지나갈 때 보니 아직도 같은 분께서 여전히 계산대를 지키고 계셨다. 당시 특유의 ‘츤데레’스러운 말투 덕에 무섭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나는 뽑기를 하고 신나서 조잘거리던 나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나랑 같은 시기에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동년배들은 알겠지만, 당시 중학교 별로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존재했다. 나는 집과의 거리 때문에 달리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렇게 선택한 중학교에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베프인 친구들을 만들었다. 평원중학교 바로 옆에는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같이 도서관에 다니던 ‘도서관 메이트’들이 존재했다. 학교가 끝나면 같이 간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는 루틴이었는데, 아직도 당시 간식으로 즐겨 먹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맛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도서관에 가기 위해선 매우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덕에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나 싶다. 글을 쓰다 보니 도서관에 매일 오는 우리를 반겨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생각이 난다. 항상 건강하시길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당시 그 친구들은 항상 연락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같이 성장해왔고, 현재 각자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원주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무실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사소한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던 유희왕 카드와 불량식품 등은 비슷한 시기를 보낸 이들에겐 폭넓은 공감대일 것이다. 지금은 막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무실초등학교를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얕은 산은 예전에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코너에 있었던 그네를 타다가 친구들과 함께 탐험한다고 그 얕은 산을 곳곳으로 돌아다녔던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자전거에 얽힌 기억도 꽤 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것도 무실동에 살던 때였고, 그렇게 배운 자전거로 곳곳을 다니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무실초등학교에서 가까이 접해 있는 송삼마을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다. 꽤나 가파르게 경사진 초입을 빠르게 타고 내려가는 것도, 마을 중간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그늘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았다.
중학교는 예상치 못한 3순위 학교로 배정받았고, 비슷한 시기 집도 학교와 정반대에 위치한 흥업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매일의 등하교가 1시간짜리 여행이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매일 같은 듯 다른 창밖 풍경을 보고, 창문에 머리 기대고 자다가 결국 연세대 종점까지 가는 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었다. 30번과 31번, 34번 버스를 번갈아 타며 보던 길과 풍경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원주에서 버스를 탈 일이 있으면 환승을 해서라도 여전히 해당 노선의 버스들을 찾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이켜보곤 한다.
원주와 관련된 기억이라면 농구를 빼 놓을 수 없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농구보단 맛있는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따라 경기장을 많이 찾았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보는 것에도, 하는 것에도 재미를 붙여 친구와 함께도, 혼자서도 꽤 자주 경기를 보러 다녔다. 어린 시절 가족과 자주 갔던 치악산도 원주만의 놀거리였지만 농구팀의 연고지라는 점이 어린 시절 원주에 애정을 갖게 했던 하나의 포인트였다.
------------------------------------------------------------------------
원주에서 태어나 삼성아파트부터 주택, 그리고 무실동으로 이사를 오기까지 내 고향은 언제나 강원도 원주로 기억되었다. 비록 지금은 학교를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뵈러 원주로 가는 기차를 탈 때면 그때 그 시절 추억에 잠기곤 한다. 백합유치원부터 평원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번 급식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칭찬빨대’를 반납하곤 했던 나는 평원초 앞 떡볶이집에서는 천원짜리 컵떡볶이를 금방 해치워 버리는 아이였다. 평원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각각 다른 문구점들이 있었는데, 친구들 별로 자신만의 선호하는 문구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무서운 아저씨가 계시던 문구사에서 뽑기를 즐겨하곤 했는데, 엊그제 근처를 지나갈 때 보니 아직도 같은 분께서 여전히 계산대를 지키고 계셨다. 당시 특유의 ‘츤데레’스러운 말투 덕에 무섭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나는 뽑기를 하고 신나서 조잘거리던 나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나랑 같은 시기에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동년배들은 알겠지만, 당시 중학교 별로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존재했다. 나는 집과의 거리 때문에 달리 선택권이 없었는데 그렇게 선택한 중학교에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베프인 친구들을 만들었다. 평원중학교 바로 옆에는 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같이 도서관에 다니던 ‘도서관 메이트’들이 존재했다. 학교가 끝나면 같이 간식을 먹고 도서관에 가는 루틴이었는데, 아직도 당시 간식으로 즐겨 먹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맛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도서관에 가기 위해선 매우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덕에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나 싶다. 글을 쓰다 보니 도서관에 매일 오는 우리를 반겨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생각이 난다. 항상 건강하시길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당시 그 친구들은 항상 연락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같이 성장해왔고, 현재 각자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원주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